원고, 항소인
유오피 엘엘씨(UOP LLC)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효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4인)
변론종결
2016. 3. 10.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가. 1) [별지 1] 기재 각 기술정보와 [별지 3] 기재 각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별지 2] 기재 공장의 개조, 유지, 보수 및 가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2) 피고의 사무실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3] 기재 각 설계도면을 폐기하고,
나. 울산 남구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서 2013년부터 건설을 시작하여 2015년에 완공한 ‘프로필렌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다. 원고들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3] 기재 각 설계도면(이하 ‘피고 설계도면’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든 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 2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17,642,471,94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주문 제2의 나항 부분의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당초 「울산 남구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서 프로필렌 생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 등의 금지와 그 공장용 반응기, 재생타워 등의 폐기」를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유오피 엘엘씨(UOP LLC, 이하 ‘원고 유오피’라고 한다)는 석유 정제, 가스 가공, 석유화학 제품 생산 및 주요 제조 산업의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등을 영업으로 하는 미합중국 법인이다. 원고 유오피는 1980년대에 이르러 올레플렉스(Oleflex) 공정의 개발에 성공하여 위 공정을 도입하려는 업체와 그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의 생산능력(Capa)에 상응하는 기술사용료(Royalty)를 지급받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2) 원고 니키 유니바사루 가부시끼가이샤(일휘 ユニバ일サル 주식회사, 이하 ‘원고 니키’라 한다)는 원고 유오피가 개발한 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 정제, 석유화학 촉매의 제조·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일본국 법인으로서 원고 유오피의 자회사이다.
3) 피고는 섬유, 화학, 중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이다.
나. 올레플렉스 공정의 개요
1)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은, ‘탈수소화 반응’을 통하여 프로판에서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과 ‘석유제품 분해과정’을 통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나뉘고, ‘탈수소화 반응’을 통한 생산 공정은 다시 원고 유오피의 ‘올레플렉스(Oleflex) 공정'과 CB&I 사의 '카토핀(Catofin) 공정'으로 구분된다.
2) 올레플렉스 공정은 ‘백금을 포함하는 촉매’를 사용하여 프로판 탈수소화(PDH) 반응에 의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인데, 그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올레플렉스 공정의 전체적인 흐름 및 단위 공정 자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신축에 착수한 2013년경 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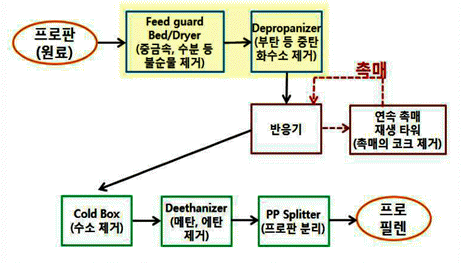
3) 좁은 의미의 올레플렉스 공정은 위 공정 중 ① 반응기 구역(Reactor Section), ② 촉매 재생 구역(Catalyst Regeneration Section), ③ 생성물 회수 구역(Product Recovery Section)의 공정을 의미하는데, 이들 각각의 공정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① 반응기 구역 : Depropanizer 유닛에서 나온 프로판 공급 원료는 먼저 4개의 반응기, 4개의 히터 및 반응기 피드 유출물 열 교환기로 구성된 반응기 구역을 거치면서 프로판이 프로필렌으로 전환된다. |
| ② 촉매 재생 구역 : 촉매를 사용한 프로판 탈수소화(PDH) 반응의 경우 반응을 거친 촉매에는 탄소가 달라붙어 비활성화 되는데, 이러한 촉매를 재생하는 구역이다. 올레플렉스 공정에서는 반응기 구역의 네 번째 반응기에서 나온 촉매를 연속 촉매 재생타워(Continuous Catalyst Regenerator, 줄여서 ‘CCR')로 보내 재생 공정을 거친 후 다시 첫 번째 반응기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 ③ 생성물 회수 구역 : 반응기 구역에서 나온 프로판-프로필렌-수소 혼합 가스는 반응기 유출물 압축기, 건조기, 극저온 시스템으로 구성된 생성물 회수 구역으로 들어가, 프로판-프로필렌 액체 혼합물과 수소 기체로 분리된다. |
다.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1) 원고 유오피로부터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권한 등을 부여받은 원고 니키는 1989. 2. 8. 주식회사 동양나이론(1996년경 주식회사 효성티앤씨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8년경 피고 회사로 합병되었는데, 이하 이들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과 [별지 2] 기재 공장(DH-1 공장, 이하 ‘용연 1공장’이라 한다)에 생산능력 16만 5천 톤 규모의 올레플렉스 공정 도입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같은 날에 일체로 체결된 아래와 같은 3개의 개별 계약으로 되어 있다.
가) 원고 유오피의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특허권, 기술정보 등 제반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허락을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갑 제3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유오피의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위 가)항의 기술정보 중 일부를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Engineering Design Specifications,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당사자들이 지칭한 대로 ‘Schedule A’라고 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도면 및 사양서의 형태로 제공하기로 하는 엔지니어링 계약(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이 제공한 각종 기술정보에 따라 건설된 올레플렉스 공장의 성능과 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증해 주는 개런티 계약(을 제83호증 참조).
2) 그 중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 유오피의 올레플렉스 공정 유닛(Unit)을 용연 1공장에 설치하고, 이를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가동하고자 한다. |
| 5. (a) |
|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 의해 피고에게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엔지니어링 디자인 설명서, 상세한 디자인 및 기타 기술 정보는 원고들의 소유로 남게 되며, 오직 이들 정보가 사용될 올레플렉스 유닛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 및 가동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복제되거나 제3자에게 개시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단, 피고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그러한 복제, 개시 및 사용의 제한을 서면으로 동의한 타인에게는 전술한 사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정보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
| 단, 위와 같은 제한사항은 (i) 피고가 원고 니키 및/또는 원고 유오피로부터 수령하기 전에 피고에게 개발되었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 (ii) 원고 니키 및/또는 원고 유오피가 피고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시점 당시 공개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공지 영역의 일부가 되어 있거나 또는 위 시점 이후에 피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지 않고 공개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 영역의 일부가 되는 정보, 또는 (iii) 타인이 피고에게 공개의 제한 없는 권리로서 제공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 단, (중략) 본 계약에 따라 공개되는 기술정보는 그 정보가 공지 영역의 더 일반적인 정보 또는 피고가 보유하는 더 일반적인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상기 예외 사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구성들이 임의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그 개별 구성이 공지 영역의 구성이거나 피고가 보유하는 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기 예외 사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결합 자체 및 그 작동 원리가 공지 영역에 있거나 피고가 보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기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 10. (b) |
| 피고는 각 유닛을 최초로 가동할 경우 원고 니키에게 각 유닛의 가동 개시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은 각 유닛별로 해당 유닛의 가동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해당 유닛과 관련하여 체결된 보증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유닛에 대한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 니키의 의무 이행 완료시 해지된다. (중략)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어떠한 유닛과 관련된 양도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술 정보의 기밀 유지 및 사용에 관한 피고의 의무 등은 없어지지 않는다. |
3) 원고들이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Schedule A는 아래와 같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별지 1] 기재 각 기술정보(이하 ‘이 사건 각 기술정보’라 한다)를 포함하고 있다.
가) PFD(Process Flow Diagram): 공정의 기본 흐름도로서, ① 각 단위 공정의 구성, 흐름, 순서, ② 각 단위 공정과 장치들 사이의 연결 및 배치 관계, ③ 각 단위 공정의 각 부분을 지나는 물질의 양, 열량, 온도, 압력 등의 데이터(이하에서는 이 사건 변론에서 당사자들이 지칭한 대로 ‘기본데이터’라 한다) 값 등이 기재된 도면이다.
나) P&ID(Piping and Instrument Diagram): PFD를 토대로 하여, 배관, 튜브, 밸브, 필터, 온도계, 압력계, 센서, 제어기 등의 구체적인 사양과 설치 위치, 그 연결 및 조합 관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재된 도면이다.
다) 장치사양서(Specification): ① 공정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의 상세 구조, 크기, 각도, 두께, 직경, 공차 등의 구체적인 수치, ② 노즐, 밸브, 배관, 센서 등이 설치, 연결될 정확한 위치와 그 구체적인 사양, ③ 디자인 데이터, 장치 제작 시 주의할 사항(Notes) 등, 각각의 장치를 실제 제작하여 조합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재된 도면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체결 후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Schedule A를 사용하여 용연 1공장을 완공하고, 1991. 9.경부터 용연 1공장을 가동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해 오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은 1996. 9. 9.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2002. 4. 24. 피고의 2001. 10. 24.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라. 피고의 새로운 프로필렌 공장 건설
1) 피고는 2012년경 용연 1공장 부지 내에 생산능력 30만 톤 규모의 이 사건 공장(DH-2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는 올레플렉스와 카토핀 공정 중 이 사건 공장에 도입할 공정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2. 7.경과 2013. 2.경 원고 유오피와 만나 올레플렉스 공정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촉매 사용 문제 등에 관한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대림산업(이하 ‘대림산업’이라 한다), 포스코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의 시공사(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이하 줄여서 ‘EPC'라 한다)에 이 사건 공장 건설을 위한 입찰초청장(Invitation To Bid, 이하 줄여서 'ITB'라 한다)을 발송하면서, Schedule A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한 ITB 도면(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에서 ’효성 Basic Design Package’로 지칭한 도면인데, 이하에서는 ’ITB 도면‘이라 한다)을 이들 EPC 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로부터 ITB 도면을 제공받은 대림산업은 2013. 5.경 ‘반응기와 재생타워 인터널(Reactor and Regeneration Internals)’ 제조업체(Vendor)인 나가오카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Nagaoka International Corporation, 이하 ‘나가오카’라 한다)에 그 견적 산출을 위해 ITB 도면 중 일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3) 위 입찰 결과 대림산업이 EPC 업체로 선정되어, 피고는 2013. 8.경 대림산업과 이 사건 공장의 신축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림산업은 나가오카에, 2013. 10.경 다시 ITB 도면 중 일부를 제공한 후 2013. 11.경 올레플렉스 공정에 들어가는 ‘반응기와 재생타워 인터널’ 장비 제작을 발주하는 한편, 2013. 12.경 이 사건 공장의 건설 공사에 착수하였다.
4) 그러나 나가오카는 2014. 1. 28. 대림산업에 원고 유오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또한 2014. 2. 5. 대림산업에 이 사건 공장의 건설을 둘러싼 원고 유오피와 피고 사이의 라이선스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계약이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5) 원고들은 2014.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림산업에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림산업 역시 2014.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4. 6. 20. 대림산업과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자체적으로 이 사건 공장의 건설 공사를 계속하여 2015. 8.경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해 오고 있다.
7)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도면은 Schedule A와 ITB 도면 이외에 아래와 같은 두 종류의 도면이 더 있다.
가) 피고와 대림산업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를 진행하였다. 대림산업은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2015. 1. 9. 그 상세설계가 반영된 설계도면[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2014. 6. 20.을 기준으로 가장 업데이트(update)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에서 ‘효성 상세설계도면’으로 지칭한 도면인데, 이하에서는 ’대림산업 최종도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후 자체적으로 이 사건 공장의 건설 공사를 계속하면서 2014. 8. 11.과 2014. 8. 21. 두 차례에 걸쳐 수정을 한 도면(이하 ‘피고 주장 실사용도면’이라 한다)이 바로 이 사건 공장(그 중 특히 반응기와 재생타워 부분)의 설계도면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10. 피고 주장 실사용도면을 을 제46, 47호증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16, 40 내지 53, 79, 100, 101호증, 을 제1, 3 내지 19, 25, 46, 47, 48, 51 내지 58, 72, 83, 87, 88, 1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용연 1공장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 및 가동에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한 후 이를 가동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①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라)목 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이들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진술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술정보 및 이 사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 설계도면의 공개와 사용을 금지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계약 위반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결과로 생긴 피고 설계도면을 폐기하며,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상당인 17,642,471,9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쟁점과 그 판단기준
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Schedule A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용연 1공장의 건설, 개조, 유지, 보수 및 가동에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시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은 1996. 9. 9.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지만,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10조 (b)항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피고가 개발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 피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지된 정보 등과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피고가 Schedule A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용연 1공장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 즉 이 사건 공장의 건설 또는 가동에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고, 만일 이를 사용하였다면 ② 그 사용 당시에 이 사건 각 기술정보가 피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지되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각 기술정보에 관하여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및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수령한 1989. 2.경 이전에 피고가 개발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던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으로 삼지는 아니한다.)
다) 그리고 위 ①, ② 쟁점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1) 어떤 기술정보의 사용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는 기본적으로 그 기술정보의 권리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이 기술정보의 사용 기간이나 범위에 제한을 둠으로써, 권리자가 사용자에게 완전한 기술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 그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설사 사용자가 그 기술정보를 사용한 결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러한 기술정보를 권리자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사용 기간이나 범위를 넘어 그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권리자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기술정보를 창작한 것이 아닌 이상 그 기술정보에 관한 권리는 여전히 이를 창작한 권리자에게 있고, 사용자의 위와 같은 기술 축적은 권리자가 창작한 기술정보를 이제는 스스로 모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 내용에 위반되는 사용자의 위와 같은 기술정보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사용자가 권리자의 기술정보와 구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정보를 창작하여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독자적인 기술정보를 창작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권리자의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권리자의 기술정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지되거나 그 기술적 가치를 상실하였는데 여기에 창작적 노력을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정보를 창작해 내었다거나, 사용자의 창작적 공헌도가 권리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커서 이제는 권리자의 기술정보와는 기술적 의미나 가치가 다른 새로운 기술정보가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등, 그 기술정보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가 오로지 사용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한편, Schedule A는 올레플렉스 공정의 공장(용연 1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갖가지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설계도이므로, 그 공지 여부나 경제적 가치도 이러한 설계도를 기초로 한 올레플렉스 공정의 공장 건설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아야 하고, 또한 어느 한 부분이나 분리된 각각의 설계 값을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보들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유기적인 일체로서 그 실체나 가치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의 약정에 의해 피고가 그 사용 또는 개시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지 여부도 Schedule A에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전체를 일체로 취급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9 내지 29, 31, 33 내지 53, 60, 67 내지70, 72, 73, 77 내지 79, 89 내지 92, 94 내지 101, 10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및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을 제2, 49, 50, 75, 76, 81, 92, 93, 94, 121 내지 12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촉매(2005년경에 용연 1공장의 공정에서 원고 유오피의 촉매를 완전히 대체하였다)를 바탕으로 용연 1공장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올레플렉스 공정의 공장 운영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였고, 또한 g-Proms, Fluent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복 실험을 한 결과 이 사건 공장에 적용할 기본데이터 및 기본적인 반응기 규격 등을 자체적으로 도출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들과 을 제63 내지 66, 133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공장의 건설은 근본적으로, 피고가 2013. 4.경 ITB 단계에서 EPC 업체들에게 Schedule A를 바탕으로 다소 수정을 한 ITB 도면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림산업은 2013. 8.경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2014. 6.경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 시까지 피고로부터 ITB 도면 이외에 다른 설계 도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나가오카에 ITB 도면 중 해당 부분을 제공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할 ‘반응기와 재생타워 인터널’ 장비의 제작을 발주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적용할 기본데이터를 자체적으로 도출하였기 때문에 PFD의 기본데이터는 다르고, 또한 이 사건 공장은 용연 1공장에 비하여 그 생산능력이 약 1.8배(30만 톤/16만 5천 톤) 증가하였기 때문에 공정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의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반응기와 재생타워 등 각각의 장치의 상세 구조나 구체적인 설치 위치, 구체적인 연결 및 배치 관계 등 설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틀은 Schedule A에서 ITB 도면을 거쳐 대림산업 최종도면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심지어는, [별지 4] ‘반응기 설계 비교’ 기재와 같이, 용연 1공장과 이 사건 공장 각각에 설치된 4개 반응기의 ‘촉매 반응구역 길이(Catalyst Bed Depth)’가 (길이 1 생략), (길이 2 생략), (길이 3 생략), (길이 4 생략)로 각각 동일하고, 4개 반응기의 ‘촉매 반응구역 부피(Active Catalyst Volume)’의 비율이 (비율 생략)으로 동일하며, 그 이외도 Schedule A와 ITB 도면 및 대림산업 최종도면에서 거의 동일한 형태의 도면, 동일한 설계수치 조합들도 다수 발견된다.
한편, 피고 주장 실사용도면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2014. 6.경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4. 8.경에 두 차례 수정되었다는 것인데, 위 각각의 수정 일자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그 이전의 수정 일자들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두 차례의 수정은 대림산업 최종도면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피고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대림산업 최종도면 이외의 설계도면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약 2개월 안에 이 사건 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프로필렌 생산 공장’을 독자적으로 설계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피고도 당심에서 Schedule A와 비교해야 하는 것은 ‘대림산업 최종도면’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피고의 2016. 1. 19.자 변론자료 7면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ITB 도면과 대림산업 최종도면 및 피고 주장 실사용도면은 모두 Schedule A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대림산업 최종도면은 피고와 대림산업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ITB 도면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상세설계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위와 같은 상세 설계도서는 통상적으로 화학공장 건설 시 EPC 업체가 실제 공장 건설 환경 등에 따라 기본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기본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 설계도서인 ITB 도면(또는 Schedule A)과 그러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림산업 최종도면이 ITB 도면이나 Schedule A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지 않았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④ 화학 반응의 기본데이터를 도출하는 것과 안정성과 경제성이 보장되는 대규모의 화학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각각의 작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내용도 다르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독자적으로 촉매를 개발했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기본데이터를 도출해냈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한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장의 생산능력이나 촉매의 종류 및 잔류 수명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 값의 차이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Schedule A와는 다른 피고의 독자적인 설계도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예를 들어,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용연 1공장의 경우 피고의 자체 개발 촉매로 대체된 이후에는 그 기본데이터 값이 변하였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용연 1공장에 Schedule A의 설계도가 사용되었다는 점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가 연구·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반응기를 보더라도 g-Proms, Fluent 등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험실 단계의 정도에 불과하여, 이로써 바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과 같은 대규모의 상업화 공장에 설치할 수 있는 반응기에 대한 설계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⑤ Schedule A에 나타난 올레플렉스 공정 설계도 중 특히 반응기와 재생타워 부분은 화학공장 설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개발의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올레플렉스 반응기는 촉매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반응하는 이동층(moving bed) 방식으로서 촉매가 고정 충전되어 반응하는 고정층(fixed bed) 방식에 비하여 그 설계가 훨씬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이 건설된 2012년경부터 2015. 8.경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 올레플렉스 공정과 카토핀 공정 중 하나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Schedule A를 바탕으로 앞서 본 기본데이터 값이나 생산능력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수정을 가하여 ITB 도면이나 대림산업 최종도면을 작성하는 정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앞서와 같이 그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개발의 성공도 보장되지 아니하는 반응기나 재생타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그 상업화가 가능할 정도로 설계도를 완성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화학공장 설계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⑥ 피고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촉매를 바탕으로 용연 1공장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올레플렉스 공정의 공장 운영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기술 능력은 Schedule A를 기초로 하여 변경된 기본데이터 값에 맞게 반응기 등의 설계를 수정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기술적 기여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정보와 구분될 수 있는 피고만의 독자적인 기술정보를 창작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이상 피고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Schedule A를 이용한 것도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3) 이 사건 각 기술정보가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될 당시 공지되어 있었는지 여부
앞서 ‘1. 기초사실’에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62, 73 내지 76, 81, 82, 84, 85, 87, 8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사용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그 사용 당시에 공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을 제3, 4, 9 내지 19, 27 내지 45, 59, 60, 68, 71, 72, 77 내지 80, 86, 89, 91, 95 내지 114, 1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바로 위의 피고 서증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착수하기 이전에 올레플렉스 공정의 기본 개념, 올레플렉스 공정의 전체적인 흐름 및 단위 공정, 각각의 장치의 기본적인 구조와 일부 수치 정보 또는 수치의 계산 정보 등이 특허명세서나 논문 또는 인터넷 자료 등에 공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위와 같은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정보가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PFD, P&ID, 장치사양서 등 실제로 공장을 건설·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기술정보로서 이미 용연 1공장 등 상업적인 공장의 건설에 사용되어 그 경제적 가치도 검증된 것인데, 이러한 기술정보까지 공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Schedule A에 나타난 올레플렉스 공정 설계도 중 특히 반응기와 재생타워 부분은 화학공장 설계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개발의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점은 앞서도 언급하였다. 즉,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공지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도 위와 같이 공지된 개략적이고 일반적인 기술정보만으로 창작해 내기가 쉽지 않은 기술정보라고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의 독자적인 촉매에 따른 기본데이터만 있으면 이에 맞추어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쉽게 설계해 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여 피고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서 ‘결합 자체 및 그 작동 원리가 공지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 구성이 공지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용연 1공장 이외의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나아가 공지된 정보 이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까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자체가 공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공지된 정보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데이터를 도출하는 것과 대규모의 화학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가 반응기나 재생타워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그 상업화가 가능할 정도로 설계도를 완성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화학공장 설계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가 공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쉽게 창작해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약정한 것과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 유오피의 최근 올레플렉스 공정의 경우 Schedule A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그 설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틀은 Schedule A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건설 당시에도 원고 유오피의 최근 올레플렉스 공정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④ Schedule A를 사용한 용연 1공장은 완공된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가동되어 오고 있다. 피고의 주장처럼 Schedule A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을 피고가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Schedule A를 사용하여 공장을 완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완공된 공장이 현재까지 가동되어 오고 있는 이상 Schedule A의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의 의무
가) 사용금지 등의 의무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고 또한 이를 가동하고 있는 행위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제5조 (a)항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기술정보 및 이 사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피고 설계도면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용연 1공장의 개조, 유지, 보수 및 가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들은 피고 설계도면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용의 금지를 구하나, 용연 1공장과 관련된 범위 내의 사용은 위 약정에서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위와 같은 목적 범위 외에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위 약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용연 1공장의 ‘가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의 가동도 중단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공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작위 의무 위반의 결과로 생겼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389조 제3항 에 의해서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389조 제3항 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한 결과로 생긴 피고 설계도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무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위반한 이상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는 그 손해배상액을 살펴본다.
(1)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프로필렌의 추가 생산량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30만 톤의 프로필렌 생산능력을 가지는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과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서 그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생산량에 대한 기술사용료 산정기준을 정해 놓았다. 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기술사용료 17,642,471,948원(그 계산 내역은 아래 참조)은 만일 피고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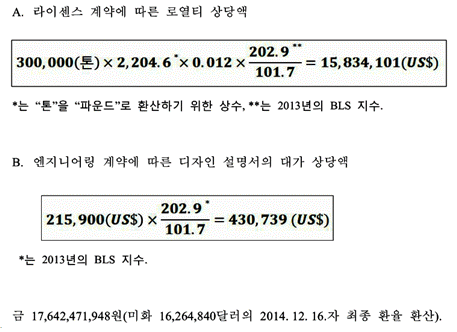
(2) 판단
(가) 갑 제3,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과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에서, 원고들 주장의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그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적인 프로필렌 생산량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① 앞서 ‘1.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과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은 2002. 4. 24.과 1996. 9. 9.에 이미 해지된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만을 지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이외에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올레플렉스 공정에 관한 특허권, 기술정보 등 제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사용료까지 지급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점, ③ 원고들과 피고의 기술사용료 약정은 원고들의 기술이 사용될 공장 및 그 공장의 생산능력을 한정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기술사용료를 1회에 전부 지급하는 방식인데,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 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의 건설에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3.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3. 10.까지 약 3년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주장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기술사용료 전액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들 주장의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 최대한도인 액수는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본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의 경위, 그 이후 사건의 경과 등과 함께, 갑 제111호증, 을 제20, 70, 71, 72, 82, 86, 114, 116, 134 내지 13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5억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① 용연 제1공장은 1991. 9.경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가동되어 오고 있고 추후로도 그 가동이 단기간 내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 역시 30년 이상 가동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한 기간은 앞서와 같이 약 3년으로 그 전체 가동 기간의 10분의 1 정도이다.
② 또한, 원고들 주장의 기술사용료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촉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밖에 특별히 원고들의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이상, 그 기술사용료 중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료 이외에 원고 유오피의 특허권이나 기타 기술정보와 관련한 기술사용료는 제외되어야 한다.
③ Schedule A를 사용하여 완공된 용연 1공장의 가동 시 원고들이 성능 보증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피고의 노력과 기술이 별도로 투입되었다. 그리고 원고 유오피의 최근 올레플렉스 공정 기술은 Schedule A와 비교하여 개선된 점이 다수 있다.
④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한 합의 금액을 300만 달러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기도 하였으나, 사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피고의 제안에 대해 사용 범위를 이 사건 공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수정 제안을 피고가 거부함으로써 그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⑤ 원고들은 톤당 약 45 달러(이 사건 공장과 같은 30만 톤 규모의 경우 총 기술사용료는 약 1,350만 달러가 된다)에 올레플렉스 공정의 기술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반면, 피고는 2015. 5.경 올레플렉스 공정과 경쟁관계에 있는 카토핀 공정의 권리자인 CB&I 사로부터 톤당 약 23달러(이 사건 공장과 같은 30만 톤 규모의 경우 총 기술사용료는 약 690만 달러가 된다)의 기술사용료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들의 손해액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2013. 4.경 EPC 업체들에게 ITB 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원고들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행위는 앞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행위들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위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고의 의무 범위도 앞서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을 근거로 인정된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더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부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어 1992. 12. 15.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구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1996년까지 계속하여 수정·제공한 것이어서 그 취득일을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 1992. 12. 15. 이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기술정보는 그 ‘수정’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89. 2. 8.경 취득한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이외에 그 ‘수정’ 부분이 독자적으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들도 위 ‘수정’ 부분만을 영업비밀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기술정보 전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사 피고가 위와 같은 ‘수정’ 부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공개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
구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각 기술정보가 포함된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영업비밀의 공개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업비밀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도 공개로 정의하고 있다], 설사 피고의 위 행위를 피고 자신의 ‘사용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동시에 ‘공개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술정보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 즉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 공개행위로서 원고들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 이 정한 행위 유형만을 부정경쟁행위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이른바 ‘한정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정경쟁행위, 즉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경쟁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없앰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위와 같이 신설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 등(이하 ‘보호주장 성과 등’이라고 한다)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본 다음, ②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과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 규정을 비롯하여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 내에서 보호주장 성과 등을 이용함으로써 침해되었다는 경제적 이익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 같은 전체 법체계의 해석 결과 보호주장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더라도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지를 독자적으로 규명해 보고, 또한 ③ 그러한 침해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관행과 질서 체계에 의할 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고 평가되는 경쟁자의 행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보호주장 성과 등이, 시장의 경쟁과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전체 법체계에 의할 때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전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들의 체계 등에서 각각의 특유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법률들에 규정된 권리 등에 의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 이는 단지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민법 제750조 의 불법행위 규정 등을 해석·적용해 보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를 규명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면서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이와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신의칙상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등의 이유로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ITB 도면을 EPC 업체들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 보면, 그것이 공개행위로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보았는데, 이러한 공개행위를 두고 피고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위 공개행위 중 피고의 사용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바로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